경기둔화에서 이제는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짙어가는 국면에서 금통위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였다. 기준금리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의아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이다. 뉴스에서 방망이를 두드리는 금통위의장의 미소 아닌 미소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라인강 기적을 사실상 이끈 독일 분데스방크의 흔들리지 않는 통화관리 중립자세를 생각해보게 된다.
독일은 인구 산업 행정 등 모든 기능에서 나라 전체가 골고루 분산되어 발전하였다. 이는 산악지대가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이 평야로 되어 있어서 지형적 특성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웃 프랑스 등과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 탄력적 국가 방어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시 기능을 분산시키고 균형적으로 발전시켰다. 만약 인구나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을 공격당하면 나라 전체의 기능이 순식간에 마비되기 쉽다. 그러나 도시가 분산되어 있으면 어느 한 도시가 함몰되더라도 다른 곳에서 전선을 재구축하여 빼앗긴 땅을 되찾을 수 있다는 논리다.
중소기업이 골고루 그리고 강하게 발전하면 설사 대외적 충격이 오더라도 이를 무리 없이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공룡기업 몇 개가 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다가 낭패를 당하면 국민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우리는 '08 세계 금융위기에도 독일이 가장 충격을 덜 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 쏠리거나 몰리면 반드시 문제를 야기하기 마련이다. 악동들이 몰려다니면 조직폭력배가 되거나 그 하수인이 되기 십상이고, 돈이 한 곳으로 뭉치면 나라경제가 위태롭게 되고,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면 결국에는 인권이 유린되고 부패가 창궐하게 되는 일은 어느 세상 어디서나 반복되어온 일이다.
독일하면 나의 뇌리에는 세 가지 생각이 맴돈다.
먼저 제1차 세계대전 후 패전국가에서 1919년 새로 태어난 바이마르 공화국이 제정한 역사상 가장 이상적이라는 '바이마르 헌법'이다. 그러나 경제를 살린다고 돈을 마구 찍어내자 화폐가치가 바람 부는 초겨울 낙엽같이 흩날리게 되었다. 이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사회는 혼란에 휩싸이고 가치관이 무너져 그들이 꿈꾸던 그 이상향은 물거품으로 변하였다.
그 와중에서 정권을 잡은 제3제국의 악령도 생각난다. 당시 독일은 철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였다. 다시 말해, 인간의 존재가치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하던 나라였다. 그런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쉽사리 집단광기에 빠져 날뛰었다는 말인가? 중우정치는 이 세상 어디서든지 언제나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보다.
제3제국 패망 후에 독일연방은행(Bundesbank)은 물가안정에 최우선가치를 두고 진력한 결과 마르크화는 세계적으로 화폐가치 "안정의 상징"이 되었다. 한 때 초 인플레이션의 심벌이었던 독일이 혹독한 인플레이션을 체험한 후에 "인플레이션 파이터(inflation fighter)"의 대명사가 된 셈이다.
1950년대 이후 독일연방은행은 다른 어떤 나라의 중앙은행보다도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전력을 기우렸다. '한강의 기적'과 달리 "라인 강의 기적"이 물가안정의 바탕에서 이루어졌기에 독일경제는 빈부격차 심화 불균형 성장 같은 부작용 없이 성장해왔다. 지금도 독일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건강한 경제 체질을 가지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다.
또 약 2,000억 마르크 이상으로 추정되는 천문학적 통일비용을 지출하여 통일 이후 독일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릴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커다란 후유증 없이 통일의 불확실성을 극복한 것도 독일연방은행의 흔들리지 않는 물가안정 노력 때문이라고 판단되고 있다. 유럽통화동맹이 결실을 맺어 유로화의 등장이 가능했던 것도 독일연방은행의 화폐가치 안정 노력이 컸기에 가능했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독일의 통화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통화관리의 중책을 맡은 분데스방크가 절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독일국민들로부터 이해와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앙은행의 정책목표가 건강하고 개방된 사회에 잘 설명되고 논의되면 될수록 그 목표는 더 잘 달성될 것이다"라고 마쉬(D. Marsh)는 지적하고 있다. 연방은행 고위직들이 정부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는 대신에 시장과 대화하며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구했기 때문에 서둘러 가자는 정치권과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약 10여 년 전 바르셀로나에서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기내에서 제공하는 신문(FT)에는 "안정의 상징 위에 드리운 그림자(shadow over a symbol of stability)라는 특집 기사가 실렸었다. 당시 남유럽 사태로 독일연방은행의 맥을 이어 받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앞길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한다. 약 1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니, 이와 같은 우려를 무리 없이 극복한 것은 독일연방은행의 저력이 유럽중앙은행으로 고스란히 넘겨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올리자 시장금리가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국고채(3년) 금리가 11월 30일 1.95%에서 12월13일에는 1.78%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이처럼 무위험금리가 하락하는 현상은 무엇인가 경제적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져가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있다는 반응을 시장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 것일까?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어떻게 되어갈까?
[b]주요저서[/b]
-불확실성시대 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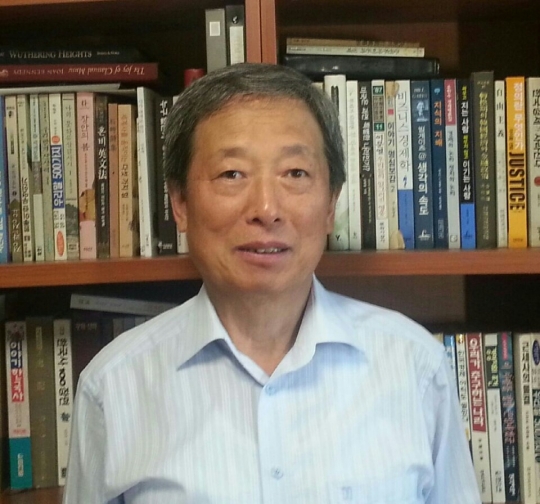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