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직접이든 텔레비전에서든 최소한 한 번쯤 보았을 세종문화회관. 기념비적 건물을 지으라는 박정희 정권에 의해 지난 1978년 완공된 공연-전시-회의 시설로, 국가 중심도로라고 할 수 있는 세종로 한복판의 입지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한옥에서 차용한 구조들은 세종문화회관을 여느 건물들과 달리 느껴지게 한다. 마치 한옥의 안채와 별채의 관계처럼 본관과 별관을 배치하고 둘을 이어주는 회랑을 조성했다. 줄지어선 육중한 돌기둥에 두꺼운 추녀, 완자문양을 가미한 벽장식 등은 고건축과 현대건축의 조화를 이루어내려는 듯 다채롭다.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은 하마터면 지금보다 더 육중하고 위압적인 모습으로 들어섰을 지도 모른다. 건립 당시 청와대에서 최소한 5천 명이 들어가는 대회의실을 갖추고 기와지붕도 얹도록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앞서 지어진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이나 만수대예술극장 등 북한의 거대한 '민족전통주의' 건축물들을 의식한 탓이다.
유신정권의 서슬이 퍼렇던 시대…. 권력의 주문을 뿌리치기 쉽지 않았을 테지만 세종문화회관은 끝내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다. 건축을 맡은 건축가가 "그것은 평양의 특징일 뿐 우리는 우리대로 만들어갈 문화가 있다"며 거절해 지금 우리가 보는 선에서 일단락되어서다.
건축가는 "건축은 시대의 상징이자 변이이다. 건축기술이 발달해서 기와를 씌우지 않고도 우리 정서가 들어가는 전통을 살릴 수 있다. 건축가에게 맡겨달라"고 했다. 전통기와를 얹고 서까래를 올린다고 해서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자칫 규모에만 집중할 경우 덩치만 큰 관제 건축물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이유였다. 그 건축가는 바로 지난 2012년 향년 93으로 타계한 엄덕문이다.
개인주택도 그렇지만 대형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도 건축주와 건축가가 갈등할 수 있다. 건축물의 세세한 디테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니는 상징성과 의미,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 등에 대한 견해 차이 등 여러 이유가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고 있는 공공건축물들을 보면 갈등은커녕 시대정신을 담기 위한 어떤 고민의 흔적도 찾기 힘들어 보인다. 그저 흔하디 흔한, 한창 유행을 끌고 있는 유리-철골 구조의 색깔 없는 건축물들 일색이다.
/'다시,서울을 걷다' 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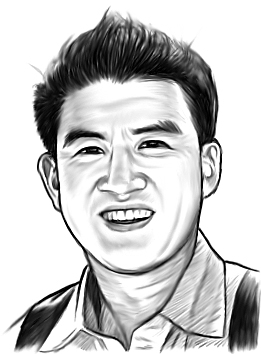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